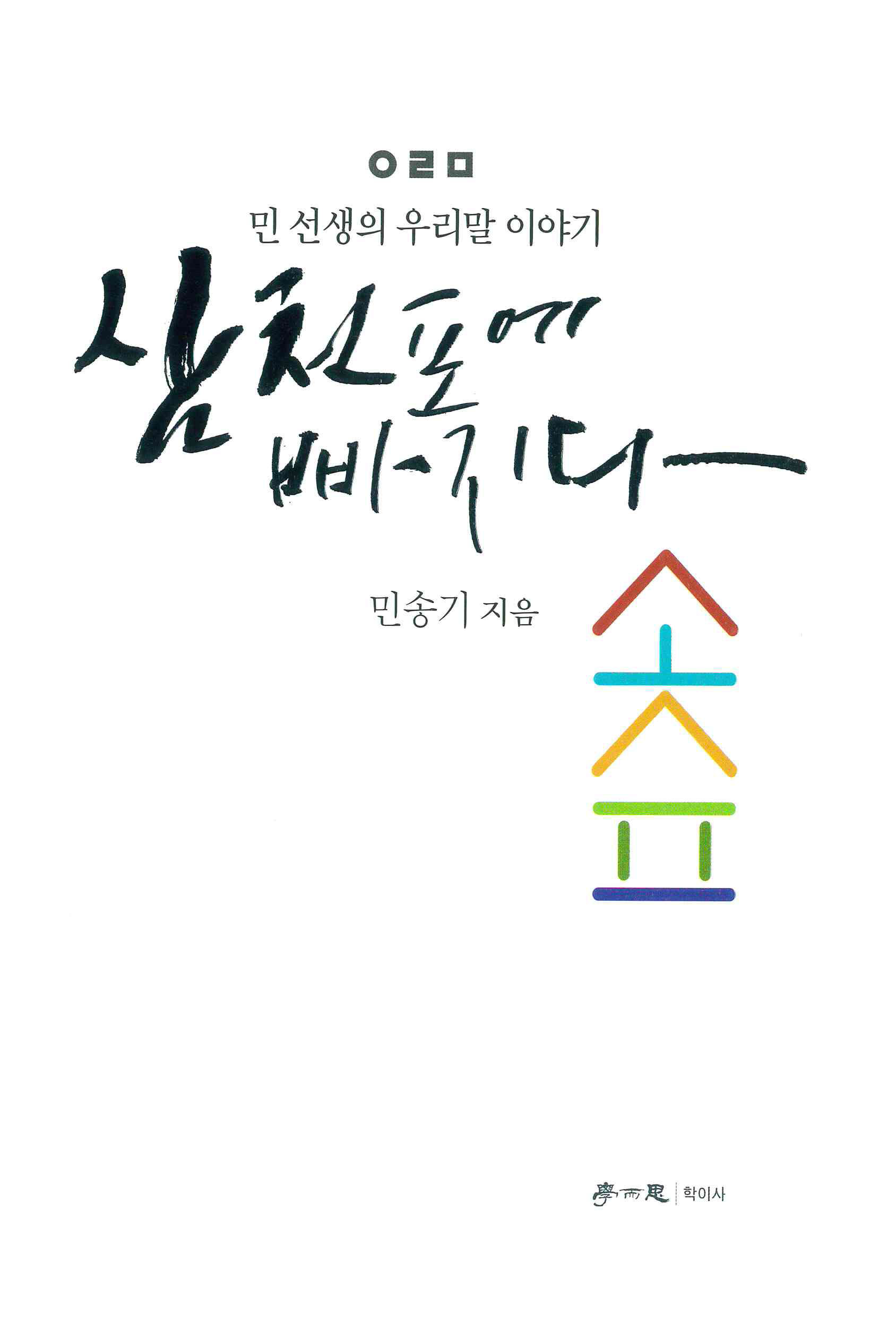우리가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과 모국어로서 우리말을 배우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 어릴 때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 미국은 거지도 영어를 잘 하네.” 하고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힘들게 배우는 외국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것인데,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은 모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능력이다. 언어 학습이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국어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로 가르치고 배운다. 그 이유는 우리말에는 의사소통 이상의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 속에는 우리말을 써온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말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 탐구해 본다는 것은 삶에 대한 성찰이고, 인간관계에 대한 탐구와 연결된다.
말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지 무균실이나 진공관 같은 곳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감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신망을 받던 자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도 말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공기처럼 실체가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인간사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말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구체적 시공간과 같은 상황 맥락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바른말 고운 말이라는 것도 인간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상도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이 문디!”라고 하는 것이 ‘문둥이’라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시키는 대로 “이 한센병 환자야!”로 순화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염병하네!”라는 일갈이 비속어이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것을 바른말 고운 말을 쓴다고 “장티푸스를 앓고 있네요.”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색한가? 이런 점 때문에 나는 표준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좁은 의미의 ‘바른말 고운 말’ 대신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바른말)’과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고운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말 이야기 1권의 제목을 ‘자장면이 아니고 짜장면이다’로 지었던 이유도 표준어보다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표준어나 문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말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표준어와 문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맞춤법이 틀렸다, 표준어가 아니다, 순우리말을 써라 등등의 지적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고 즐겁지가 않다. 반면 재치가 번득이는 말로 재미있게 말할 줄 알고, 주고받는 말의 궁합이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해도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말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대학교 때부터 국어 교사 생활을 20년을 한 지금까지 나는 ‘우리말에 대한 교육이 왜 필요한가?’,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안고 산다. 이것은 직업인으로서의 고민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분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어서 교육과정 해설이나 논문으로 여기에 답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답들은 너무 막연해서 잘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소소하지만 우리말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실제 사례들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글로 정리를 해 왔다. 우리말 표현의 미세한 차이, 어원과 같은 우리말에 대한 지식, 말이 사회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 등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중요한 사례들을 최대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려고 노력을 해 왔다.
정확한 표준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삼천포로 빠진’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도시 삼천포에 가 보면 뜻하지 않게 아름다움에 빠져볼 수 있듯이 이 책을 읽으면서 뜻하지 않게 우리말의 재미에 푹 빠져 볼 수도 있을 것이다.